리뷰
‘무대에서 놀기’와 ‘무대를 놀기’ 사이
글쓴이 소개
박종현
국민대학교 교양학부 겸임교수이자 재단법인 월드뮤직센터의 기획자이다. 인류학 연구자, 대중음악 창작·연행자이기도 하다. 제11회 국립국악원 학술상 평론 부문을 수상하였다. 창작자로서 독집 음반(〈생각의 여름〉)이 〈EBS SPACE 공감 2000년대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에 선정된 바 있다.
국민대학교 교양학부 겸임교수이자 재단법인 월드뮤직센터의 기획자이다. 인류학 연구자, 대중음악 창작·연행자이기도 하다. 제11회 국립국악원 학술상 평론 부문을 수상하였다. 창작자로서 독집 음반(〈생각의 여름〉)이 〈EBS SPACE 공감 2000년대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에 선정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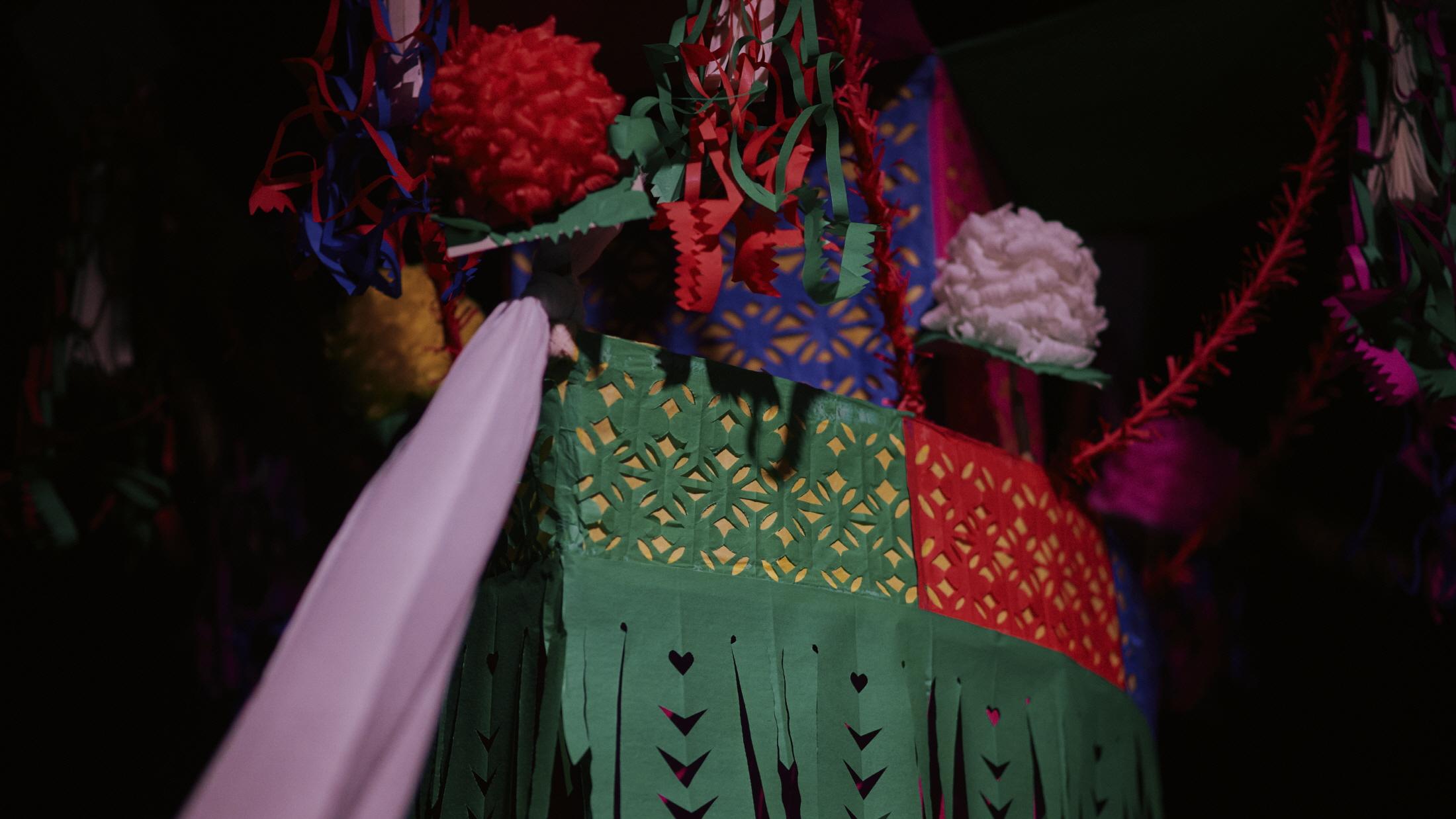



내용
2025년 수림뉴웨이브 '결: 예술가의 시간'성휘경〈용선가: Ludens〉 공연 리뷰
‘무대에서 놀기’와 ‘무대를 놀기’ 사이
전통 연행예술 즉 ‘판’의 장르에서 사용하는 상찬 중 ‘잘 논다’는 표현이 있다. 들여다보면, 서로 연관되지만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 ‘놂’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말 속에 담겨 있다. 오래 갈고닦은 기량과 빛깔을 깊은 집중 속에서 마음껏 뿜어내며 즐기는 모습이 성공적으로 전달될 때 떠오르는 ‘잘 놂’이 한 가지라면, 관객을 포함한 판 전체를 장악하고 ‘들었다 놨다’함으로써 하나의 연행 사건을 자신의 것으로 완성해 건네는 ‘잘 놂’이 다른 한 가지이다. 전자가 순간 속에서 드러난다면 후자는 순간들이 모여 덩어리진 시간으로부터 다가온다. 전자가 몸짓, 소리짓이라는 단위 자체에서 배어나는 것이라면 후자는 그것들을 갖고 배치·조직하는 행위들의 지평에 관한 것이다. 결국 전자가 ‘판/무대 위에서 몸과 소리를 (잘) 놀기’라면 후자는 ‘몸과 소리로써 판/무대를 (잘) 놀기’에 가깝다. 전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후자란 불가능하다. 후자가 결여된 전자는 공허한 뽐내기에 머문다.
올해 〈수림뉴웨이브〉가 제시한 〈결: 예술가의 시간〉이라는 주제어에 맞추어 연주자 성휘경이 꺼내어든 자신의 시간에는 〈Ludens〉 즉 ‘놀이/노는 자’라는 단어가 표제로 걸리었다. 대금 연주자로서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동시에 강릉 단오제의 양중으로 활동하며 체득하고 탐구한 무악 그리고 타악의 요소들을 자신의 창작에 녹여내고 있는 삼십 대 중반의 예술가는, 연행자라는 업(業)을 지닌 모두의 근원적 고민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놂’이란 개념을 자신의 이름을 내건 무대의 주제어로 내세우고 이를 〈용선가〉라는 (광의의) 무악적 개념 곁에다 놓았다. 이는 평자로 하여금, ‘무대에서 무악으로부터의 재료들을 가지고 와 놀기’, ‘무악적 관념의 계(界)라는 무대를 빚고 놀기’, 혹은 둘 다의 지향을 공연의 표제로부터 선포한 것으로 예상하며 공연을 마주하게끔 하였다.
사전에 주어진 리플렛 속에서 강조된 것은 이 중 후자의 측면이었다. “동해무속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중략) ‘신앙적 성격을 띤 놀이’로 바라보고 창작 및 재구”한다는 표현에서 이러한 지향이 엿보였다. 하지만 실제 연행 속에서 ‘무속적’ ‘신앙적’ 차원의 주제가 작품 내적으로 파고들어지지는 않았고, 음악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다루어진 것은 전자의 측면이었다. 특히 단오제를 여는 ‘문굿’의 요소를 활용한 〈프롤로그: 문〉, 복수의 장단과 무드를 접붙여나가며 반(半)즉흥적 진행 구조를 이룬 〈부정풀이: 신아위〉, 드렁갱이 장단을 활용한 〈드렁: 공명〉과 같은 초·중반의 레퍼토리는, 주인공 스스로가 공연 중간에 이야기하였듯 “전통의 어떤 장단들에 대한 맛이나 이런 것들을 선보여 재미있게, 좀 즐기실 수 있게”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음악적 놀이”를 보여주려는 듯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여겨진다. “동해무속”이라는 자장 속의 어떤 것들을 재료로 건져내어 그것을 ‘갖고 노는’ 모습은, 대금, 장구, 꽹과리, 태평소, 그리고 소리와 구음의 영역까지 넓고 깊게 탐구·연마해온 시간을 느끼도록 하는 성휘경의 기술적 역량을 통해, 그리고 역시 복수의 악기를 안정적으로 넘나들며 즐기듯 협연한 이재하, 이정민, 김민석, 이충현의 뒷받침을 통해 충분히 평자에게 즐거운 순간들로 건네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의 초두에서 둘로 구분한 ‘잘 놂’ 중 전자 즉 ‘무대에서 잘 놀기’라는 측면에서 이 무대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하고 싶다. 그러나 이러한 ‘잘 놂’의 순간이 후자의 ‘잘 놂’ 즉 ‘무대를 잘 놀기’로 화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회의적이다. 비평의 입장에서 두 가지 측면을 논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개별 레퍼토리 내부에서 혹은 각 레퍼토리들끼리 접붙는 ‘재료’들이 그 접붙음을 통해 ‘곡’ 혹은 ‘공연’이라는 덩어리의 표제/주제 안에서 수렴되어 선언된 제목과 공명한다기보다 다양한 한반도 음악의 요소들을 붙이는 순간적 “재미”를 이루고 흩어지는 구성으로 고안되었다는 점이다. 부정굿으로부터 나오는 〈부정풀이: 신아위〉의 내드름을 지나다 불현듯 철현금·철가야금이 등장하며 재즈 트리오의 잼 세션에 가까운 분업적 연주로 당황스레 이행할 때, (스스로 말하였듯) “공기가 무거워질 것 같아 이러한 것들을 타파해보고자” 용선가 레퍼토리의 뒷부분에 뱃노래를 접붙이는 일 등은 음악가의 재기를 느끼는 찰나를 제공하는 데 기여했을 수 있지만, 하나의 곡 속으로 혹은 ‘루덴스’라는 제목을 가진 하나의 맥락적 판 안쪽으로 관객인 평자를 끌어당기는 데는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판 위에서의 놀이’로서 미덕을 갖추었지만, ‘놀이라는 이름의 판’으로 빚어졌다는 판단이 서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음악적 ‘결’과 관련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부정풀이〉와 마지막 〈미니어〉를 포함한 모든 곡이 무악으로부터의 주제 아래 그와 관련된 요소를 활용하여 (소개글과 인터뷰에서 언급되었듯) “동시대적 감수성”으로 풀어내려 하였겠으나, 여러 곡을 들으면서 외려 1990년대-2000년대 ‘국악가요’ 내지는 초기 ‘퓨전’의 어떤 스타일을 곧바로 떠올리게 되었다. 테마 선율에 트라이아드 코드를 가야금·거문고의 아르페지오 터치로써 입힌 뒤 타악기, 관악기들이 그 사이를 채우거나 자국을 내며 지나가는 방식이 그러한 떠올림의 한 이유인 듯하다. 이러한 (의도치 않았을) ‘크로스오버적 세속악 장르(들)’의 클리셰 환기 역시, 연행과 연행자의 의도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데 방해를 야기하는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젊고, 재능있고, 또 발전하고 있는 연주자의 현재를 오롯이 자신의 이름 아래 펼치는 〈수림뉴웨이브〉 무대에서 성휘경은 연주에 있어서의 다재다능함, 그리고 그간 일구어온 넓은 음악적 토양에 기반해 빛나는 순간들을 만들어내며 ‘무대에서 잘 노는’ 음악가임을 증명하였다. 특히나 연행 및 인터뷰 모두에서 드러난 깊은 집중력, 호기심, 일관된 진지함은 앞으로의 그의 행보에 더 큰 기대를 갖게끔 하였다. 다만 공연 중간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대담에서 “분위기를 무겁지 않게 만들고 싶다”,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와 같은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러한 생각이 곡 짓기 방식 및 공연 구성 방식에 있어 어떤 타협, 혹은 판을 덜 장악하려는 태도를 낳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공연장을 나섰다. 글 초두에 적었듯, ‘무대에서 잘 놂’이 없이 ‘무대를 잘 놂’은 있을 수 없다. 이미 ‘무대에서 잘 노는’ 법을 아는 연주자이기에, 그 기량을 바탕으로 특유의 무거움과 진지함을 외려 더 밀어붙여 중력을 만들어내는 데 좀더 주력하였다면 더 많은 미덕을 지닌 무대예술 작품으로서의 〈용선가: 루덴스〉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만의 중력으로 관객을 끌어들여낸 ‘판’을 만드는, 그리하여 그것을 ‘통째로 잘 노는’ 예술가의 모습을, 이다음에 만날 ‘성휘경의 시간’ 속에서 기대해 본다.

